
처음 오는 곳은 아니지만 여수 여행은 언제나 설렘으로 가득한 것 같다. 여수에 도착하면 머릿속의 카세트 플레이 자동으로 플레이 된다.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 여수를 생각하면 처음으로 떠오르는 것이 여수 밤바다가 아닐까.



숙소에 짐을 놓고 이순신 광장으로 나왔다. 북부지방은 후텁지근하고 더웠는데, 이곳은 따가울 만큼 햇살이 강했다. 그래도 날이 맑으니 기분이 저절로 업이 되었다.


광장에서 돌산대교가 보였다. 주각의 한쪽은 장군도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



세워진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이순신 광장의 조형물은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은은하게 바람을 따라 느껴지는 바다의 짠 내. 아침에는 서울에 있었는데 오후에 여수에 있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길가에 핀 꽃은 설렘 가득한 여행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레트로한 감성(?) 아니면 구닥다리 건물이라 해야 할까. 요즘 표현으로 레트로 감성 가득한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창가에 기대어 와인을 마시며 바다를 보는 상상을 해보았다.


햇볕은 뜨겁지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땀을 식혀주었다.



우리가 타려고 했던 미남크루즈가 장군도를 지나 항해를 시작했다.







언제 타봤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 여수 케이블카는 끊임없이 바다를 건너고 있었다.


미남크루즈는 서서히 돌산과 여수 사이 바다에 접어들어 속도를 냈다. 이번 여행의 메인이 미남크루즈에서 여수의 야경을 보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쉬웠다. 이놈의 미련이란 감정은.





아빠도 크루즈를 탄다는 기대감이 컸는데 멀리서 보기만 해야 하는 점이 아쉽다고만 하셨다.




매번 보던 시각이 아닌 다른 시야에서 이곳을 바라보면 또 어떤 느낌이 들까.




크루즈를 못 타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곳 여수, 특히 여수 바다를 보고 있는 지금이 행복했다.




우중충한 날씨의 서울을 벗어나 맑은 하늘을 보고 있는 이 순간은 우리의 소확행이었다.






걷다 보니 땀이 많이 났다.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이곳은 장마와 상관없는 것 같아 보였다. 카페에서 뼛속까지 시원하게 해줄 커피를 사서 벤치에 앉아서 마셨다. 카페에서 마실까 생각했지만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며 마시고 싶어서 밖이 살짝 덥지만 밖으로 나왔다.



더운 날씨 때문에 체력이 금방 방전되는 것이 느껴졌다.


저 크루즈는 어디까지 갔다 오는 것일까? 우리가 그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사이 다시 미남크루즈가 보였다.


배의 갑판엔 사람들이 많았다. 속으론 뜨거울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낮에 타면 갑판이 뜨거울 것 같지만 나중에 오면 한번 타보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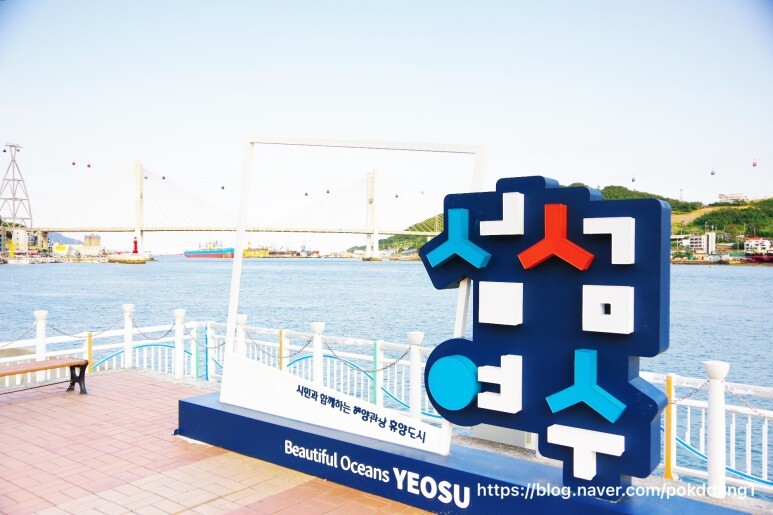
섬섬여수. 섬과 섬이 많은 곳이기에 이 도시의 브랜드명은 섬섬여수인 것 같았다. 섬섬이라는 말의 어감이 부드러워서 좋았다.




그늘에 앉아 커피를 마시니 다시 체력이 올라왔다. 그사이 뜨거웠던 햇살도 많이 누그러졌다.




하멜 등대가 보였다. 딱 저기까지만 걸어갔다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항구엔 작은 배들이 정박해 있었다. 파도가 없는 바다는 호수같이 느껴졌다.





서쪽 하늘은 주황색으로 또는 보랏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었다. 이제 낮은 고요함은 사라지고 진정한 여수 밤바다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오고 있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니 매분마다의 하늘의 모습은 다르게 보였다. 아니 내가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다.


뜨거운 한낮보다 지금 저 케이블카에서 이 바다와 여수를 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멜등대로 오니 하늘은 절정을 향해가고 있었다. 뭉크의 절규에 나오는 하늘색으로 하늘은 점점 극적으로 변해갔다. 황홀했다. 오늘 하루가 또 이렇게 가는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아빠는 사진 속에서지만 하멜 등대를 이렇게 저렇게 한 손으로 들어 보았다.







타지마할을 들 듯이 꼭지만 잡아서 들어도 보았다. 꼭 해외에서만 저런 설정 사진을 찍을 필요가 있을까. 일상에서도 이렇게 즐길 수 있는데 말이다.





나는 넋을 놓고 하늘과 바다를 보고만 있었다.







이제 길가의 가로등에는 하나둘 불이 켜지고 있었다. 하루가 참 짧게만 느껴질 뿐이었다.





하멜등대를 보러 온 관광객이 꽤 많았다. 여수 밤바다 주변의 포차에는 관광객들로 벌써부터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는 식당들이 많이 보였다.


하멜전시관 앞에서 작은 공연이 있었다. 가수가 유명하든 무명이든 이 순간만큼은 최고의 공연을 펼치고 있었다.





여수의 노을이 너무 좋기에 하멜등대 부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이 지나면 또 내일은 서울로 돌아가야 하기에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고 싶었고 아쉽다 않게 즐겼다.



이제 해도 완전히 사라지고 동쪽에서부터 어둠이 몰려왔다.


맛집들은 웨이팅도 길고 먹고 있는 사람도 많기에 맛집들은 지나치고 손님이 조금 적은 곳으로 왔다. 맛집이 뭐 대수인가 내가 먹어서 맛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여수에 왔으니 문어 삼합을 먹어봐야 하지 않을까.


문어 삼합을 먹다 보니 술이 오늘따라 술술 들어갔다. 그리고 문어 라면까지. 차 없이 온 여행이기에 술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너무 좋았다. 오래간만에 아빠와 진솔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다.


저녁이 되니 공기가 선선했다. 맥주 몇 잔을 마시니 알딸딸한 게 기분이 좋았다. 숙소로 바로 들어가기 아쉬우니 다시금 하멜등대 쪽으로 향했다.


이제 바다는 까맣게 물들어 있었다. 까만 바다엔 조명 불빛만이 잔잔하게 흔들거릴 뿐이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온 것일까? 사람들도 북적이고 이제 좀 관광지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쿵짝쿵짝의 소리도 시원한 밤바다도 모든 게 행복한 밤이었다.





낮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낮과 밤 모두 매력이 있는 도시였다. 지금부터가 여수 밤바다의 시작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게 동결되었던 시절이 언제였는지 모르게 이곳은 활기를 띠었다.





어느덧 시간은 10시를 넘어 11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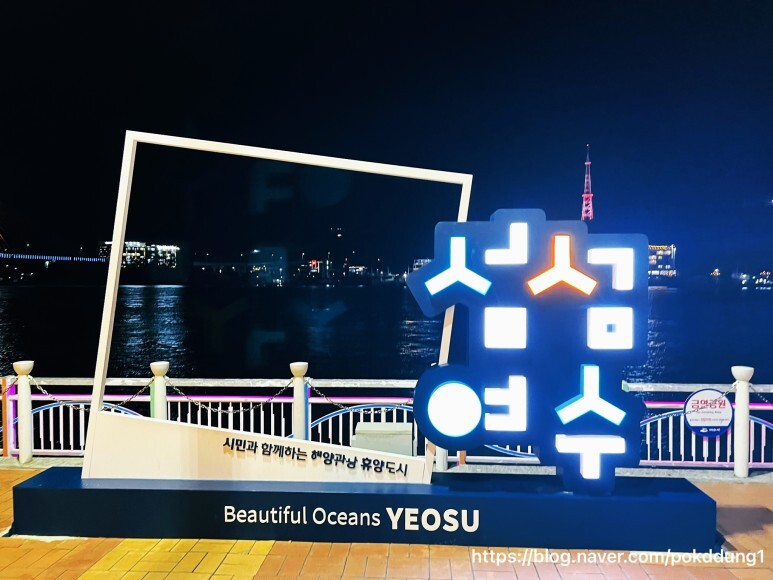




밤바다를 바라보며 따라오는 그 길에서 나도 모르게 장범준의 '여수 밤바다'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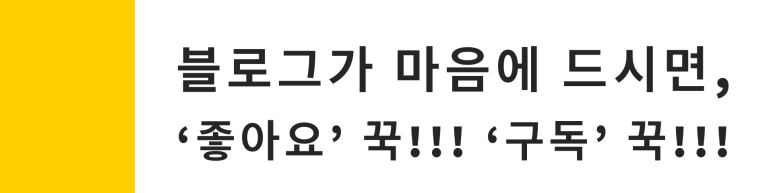

'My Daily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2 Jun 1.1 하이원 리조트 추추파크 레일바이크 (0) | 2022.07.22 |
|---|---|
| 2022 Jun 1.3 여행은 항상 아쉽다(KTX516) (0) | 2022.07.19 |
| 2022 Jun 1.1 KTX 타고 용산에서 바다가 있는 여수로의 여행(KTX511) (0) | 2022.07.04 |
| 2022 May 1.2 5월의 해운대해수욕장 (0) | 2022.05.26 |
| 2022 Apr 1.6 교토 느낌 그대로, 진해 여좌천 벚꽃 터널 (0) | 2022.05.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