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아나우에서 일박을 한 후, 남섬의 동남쪽에 위치한 더니든이라는 도시로 이동을 했다. 또 며칠만에 도시인지, 도시에 들어오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사이 슬로우 라이프에 익숙해진 것일까? 도시 근처로 오니 차도 많아지고 집들도 많은 것이 어색했다. 일단 신호등이 있어서 신호를 기다리는 것도 이상했다. 오클랜드, 웰링턴, 퀸즈타운 등 나름 뉴질랜드의 대도시들을 거쳐서 이곳까지 왔는데, 사람이 많은 곳은 어색하다.


테아나우에서 더니든으로 가는 길은 흐렸다. 북섬을 여행하면서는 날이 좋은 날이 많았는데, 남섬을 여행하면서 맑은 날을 보기 너무 힘든 거 같았다.



어디 있느냐에 따라 날씨며 풍경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았다. 이제 남섬 서쪽 산맥지대를 지나 동쪽으로 향했다. 서쪽의 거대한 산맥들을 보고 있으면 반지의 제왕이나 호빗 영화가 떠올랐다. 이쪽 빙하 지역에서 영화를 찍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따로 시간 내어 가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10일이였기에 이 짧은 시간동안 뉴질랜드의 모든 곳을 다 구경할 시간은 부족했다. 지금 생각해도 아쉬운 점은 찍고찍는 여행이였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빙하도 걸어보고, 멋진 풍경에 취해서 하루정도 한량같이 지내보고 싶은 곳도 있었는데, 일정에 쫒기는 여행이였다.


숙소에 짐을 일단 푼 후, 차를 가지고 시내로 들어왔다. 그런데 시내에서는 주차할 장소를 쉽게 찾지 못했다. 주차를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일단 주차를 하기는 했지만 마음은 불편했다. 그리고 이곳의 날씨는 왜 그렇게 안좋은지, 지금은 뉴질랜드의 여름인데 비바람이 불기에 두꺼운 잠바를 꺼내 입어야 했다. 진짜 날씨가 예측이 되지 않았다.


그래도 유럽의 느낌이 도시 곳곳에 많이 남아 있었다.


더니든의 명소 중 하나인 기차역으로 갔다. 뉴질랜드를 여행하며 기찻길을 지나간 적은 있지만, 기찰르 본적이 없었다. 유럽풍의 기차역을 보니 이곳이 영국의 식민지였구나라는 생각이 그때서야 들었다. 영국의 지방 소도시에 놀러온 느낌이랄까!





기차역으로 들어오니 건물 안은 밖보다 더 화려했다. 밖은 검은색과 흰색의 심플했지만, 기차역 안은 파슽텔 톤으로 아늑하면서 고급졌다. 기차를 타려는 손님보다는 관광객이 더 많은 것 같았다.



오! 이런 곳까지 사람이 와서 살았다는 것이 신기했다. 더니든보다 더 남쪽에 있는 도시인 인버카길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도 충분히 오클랜드에서 먼 곳이였다. 왠지 이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남극에 닿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남극까지는 한참을 더 가야하지만, 마음은 남극으로 가는 느낌이였다.



역사의 2층으로 올라와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모자이크 타일로 된 바닥은 아래에서 봤을 때 보다 위에서 보았을 때 더욱더 화려했다. 이곳을 이용했을 과거의 사람들을 상상해 보았다. 남자들은 정장을 입고 모자를 쓰고, 여자들은 드레스를 입고 이곳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모습, 드라마 다운턴 애비에 나왔을 법한 사람들이 이곳을 다녔을 상상을 하니 이곳의 분위기와 제법 어울릴 것 같았다.


모든 바닥은 타일로 되어 있었다. 목욕탕의 느낌과 사뭇다른 바닥의 느낌에서 고급짐과 세월이 느껴졌다.


기차역에 왔으니 플랫홈으로 나가 보았다. 이곳도 유럽과 같은 시스템일까? 플랫홈으로 가는 우리를 잡는 직원이 없었다. 그리고 플랫홈에는 기차가 정차해 있었다. 어디로 가는 기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은빛의 심플한 디자인의 기차가 승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뉴질랜드에서 기차를 타볼 일이 없어서 아쉬웠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저녁 6시라 아무런 계획없이 어디로 훌쩍 떠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 같았다. 아쉽지만 그냥 눈으로 기차를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날씨는 전혀 예측이 되지 않았다. 비가 내릴듯 말듯, 그리고 바람은 왜 그렇게 부는지 바람때문에 더 춥게 느껴졌다. 나는 거기에 여름이라고 샌달까지 신고 다녀서 발가락 끝이 너무 시렸다. 한여름에 동상을 걱정해야 했다.



도시 곳곳을 걷다 보면 오래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1863년이면 우리는 조선에 살고 있었고, 아마 두 양난으로 나라가 힘든 시기였던 것 같다. 아직도 이런 건물들이 남아있는 것이 신기했다.


이곳에 와서야 뉴질랜드가 유럽사람들, 특히 영국의 식민지였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다른 곳을 여행할 때는 자연풍경을 보기 때문에 그다지 영국의 식민지임을 느끼지 못했다. 인간이 만든 조형물들을 보고 있으니 이곳의 역사에 대해 새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른 저녁시간이지만 이렇게 거리에 사람이 없을까? 도시에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곤 관광객 몇명과 지나가는 차들이 전부였다.


날도 춥고 도시도 스산한게 유령도시를 구경한 것 같았다. 날이 좋았으면 이뻤을 도시인데 우리의 마음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으시시한 도시이 분위기만 마음에 남았다. 주차한 차도 불안해서 숙소로 다시 돌아왔다. 역시 주차장이 있는 숙소가 제일 마음 편한 것 같다.


숙소 근처에 있는 해변으로 나가 보았다. 날이 조금씩 개는 것 같기는 하지만 파도를 보니 해변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다. 남태평양일까 남극해일까 먼 바다에서 끊임없이 이곳으로 파도가 밀려왔다. 바람은 우리를 저 멀리 날려 보낼 것 같았다. 바람을 타고 바닷물이 육지로 날아왔다.


도로 아래에서 봤을 땐 평온해 보이는 곳이였지만, 위로 올라오니 성난 파도를 만날 수 있었다.





거친 바람이 즐거운지 갈매기들은 바람을 맞으며 이 거친 날씨를 즐기는 것 같았다. 우리에게 더니든은 우울한 날씨와 비바람 밖에 남지 않았지만, 뉴질랜드에서 가장 유럽의 느낌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A. Dunedin Railway Station 3074332, Dunedin Central, Dunedin 9016 뉴질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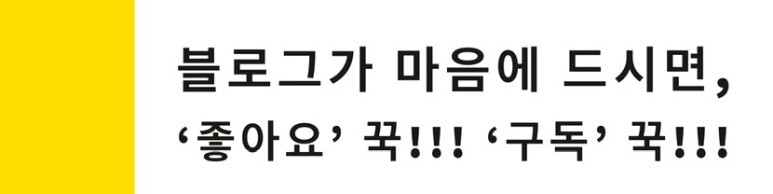

'Earth-traveler > New Zealand & Australia'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7 Jan 1.17 크라이스트처치에서의 하루 (0) | 2022.01.19 |
|---|---|
| 2017 Jan 1.16 크라이스트처치로 가는 길(더니든 로얄 알바트로스 센터, 테카포 호수) (0) | 2022.01.18 |
| 2017 Jan 1.14 방하가 만든 작품 피오르드 즐기기, 밀포드 사운드 (0) | 2021.07.26 |
| 2017 Jan 1.13 압도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퀸즈타운 (0) | 2021.07.19 |
| 2017 Jan 1.12 뉴질랜드에서 만난 빙하, 프란츠 조셉 빙하 (0) | 2021.07.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