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여행은, 아니 여행은 왜 그렇게 항상 바쁜 것일까?! 일정을 빡빡하게 세우지 않는다고 다짐을 하지만 결국에는 바쁜 일정이 되고 만다. 시드니에서의 첫날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브리지를 보고 다시 숙소로 돌아오니 하루가 지나가 버렸다.


둘째 날은 시드니 근교 투어를 한국에서 미리 신청해 두었다. 뉴질랜드와 호주 울루루에서 렌터카를 운전해 보았기에 투어보다는 개인적으로 가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붙어 있었다.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시내 운전에 대한 불안함이 들어서 일일투어를 신청하고 떠났다. 다음에 다시 간다면 아마 렌터카로 여행을 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투어이기에 생각 없이 따라만 다녀도 되는 점이 너무 행복했다. 내가 여행을 계획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나도 이런 날은 쉬는 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


시드니 근교에 있는 블루마운틴으로 향했다. 블루마운틴, 너무 익숙한 이름이었다. 커피 이름도 블루마운틴이 있지 않은가! 울루루에서는 드넓은 평원을 느낄 수 있었다면, 이곳에서는 호주의 산을 느낄 수 있었다.


링컨스 락에 오르니 우리와 같은 눈높이를 가진 산들이 펼쳐져 있었다. 펼쳐져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우리나라 산은 뾰죡뾰족한 반면 이곳의 산은 평평했다. 대지가 형성되고 시간이 흐르며 협곡이 생겨서 높고 낮음이 형성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며칠 전 멜버른에서 퍼핑 빌리 트레인 투어에서 가이드가 호주 아이들은 산을 그리라고 하면 우리처럼 뾰족하게 그리지 않고 앞에 보이는 산처럼 평평한 산을 그린다고 했던 것이 생각났다. 왜 아이들의 머릿속에 정상이 평편한 산을 그리는지 알 수 있었다. 위에서 보면 협곡의 연속이고 아래에서 보면 높은 산이 연결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다.






특별한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바위 끝에 가면 천 길 낭떠러지가 있었다. 실수로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자연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 안전장치기 없기에 무섭기도 했다.




누군가는 멋진 인생 사진을 남기기 위해 바위 끝에 서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 아빠와 나는 다리가 너무 후들후들 거렸기에 계속해서 가장자리와는 거리를 두고 사진을 찍었다.


아슬아슬한 묘미도 있지만 주변에 거칠 것 없는 풍경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이렇게 멀리서 링컨스 락을 찍어보니 더욱더 위험해 보였다. 그러나 저곳에 서서 바라보는 풍경만큼은 최고였다.


어떻게 산이 저렇게 생겼을까! 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우리가 보았고 생각했던 관념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깨지는 것 같았다.


링컨스 락에서 에코포인트로 옮겼다. 그곳에는 세 자매 봉이 있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이런 바위에는 꼭 하나의 전설이 있기 마련인 것 같다. 가이드가 전설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지만 우리는 학구적인 여행객이 아니었기에 인증숏만 찍으며 가이드의 설명은 한 귀로 들어왔다 다른 귀로 흘러 나갔다.


에코포인트의 가장자리는 펜스가 있어서 안정감이 들었다. 링컨스 락이 어드벤처를 즐기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친 여행지라면 이곳 에코포인트는 블루마운틴을 편안하게 관망할 수 있는 전형적인 관광지라는 느낌을 받았다.



길쭉한 바위 세 개가 자매처럼 서있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마음을 압도하는 대자연을 너무 많이 보고 왔기에 시시하다는 느낌도 들었다. 뉴질랜드의 거친 자연과 호주의 그 스케일을 알 수 없는 자연의 모습을 보았기에 웬만한 풍경은 눈에 차지 않았다.


링컨스 락은 부러질 것 같은 탁자 같은 바위 위에 올라 대자연을 감상하는 것이라 무섭기도 하지만 풍경이 주는 짜릿함이 컸다. 반면 에코포인트에서 바라본 풍경은 심리적인 안정감이 느껴졌다. 20대였다면 링컨스 락에 올라 별별 사진을 다 찍었을 테지만 지금은 바위 가장자리에 가는 것도 무서워 쩔쩔 매는 성격이니, 에코포인트가 마음은 편했다.


에코포인트에서 시간을 많이 주어서 사진을 찍고 주변을 구경했다.



직사광선이 바로 내리쬐는 곳이었다. 한국에서는 지금 잿빛 하늘을 볼 수 있을 텐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파란 하늘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대신 자외선이 강해서 피부도 빨리 타고 따갑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푸른 하늘이 너무 좋았다.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 길가의 나무도 걷던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가이드가 이제는 케이블카 및 다양한 탈것을 타면서 이동한다고 팔찌같이 생긴 표를 주었다. 그리고 안내 지도도 덤으로 같이 주었다.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줄을 서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인 아니면 중국인이었던 것 같다. 서로 눈치를 보며 줄을 서는데 가이드 간 서로 먼저 자신들의 손님을 태우기 위한 눈치 싸움이 대단했다. 케이블카를 타고 반대쪽 산으로 넘어왔다.


케이블카에 내린 후 또 걸어서 거의 수직으로 내려가는 열차를 타기 위해 플랫폼에 섰다.



가파른 지형에 만들어진 플랫홈이라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 열차의 좌석도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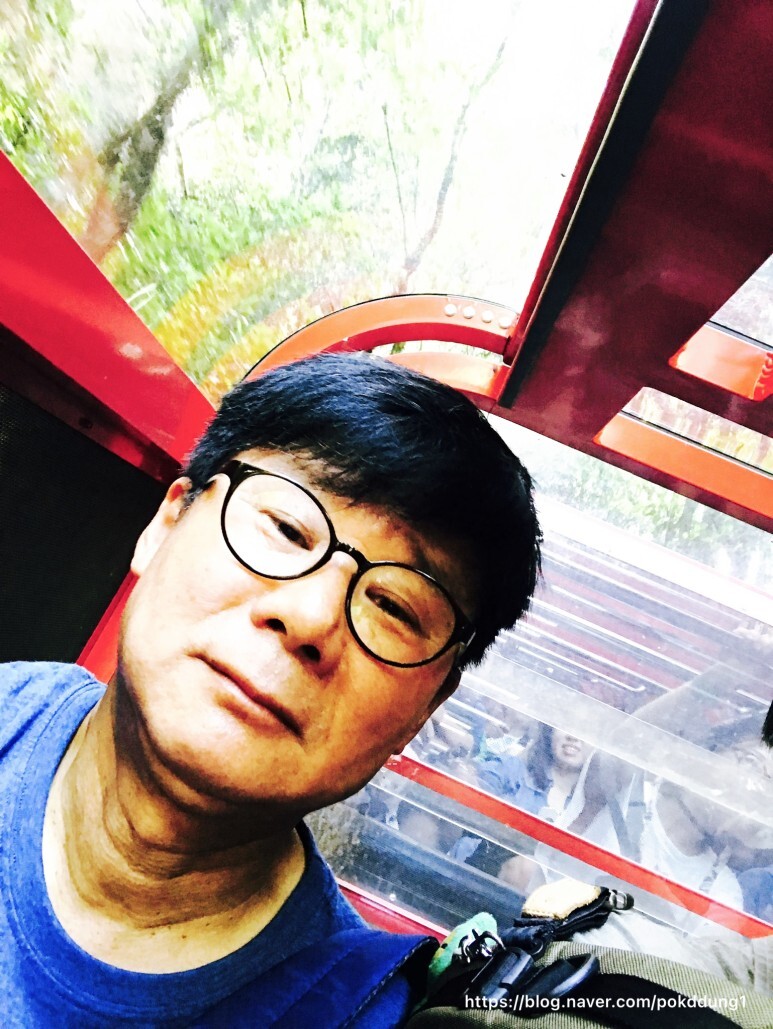
우리 차례가 되어 자리에 앉았다. 밖에서 볼 때보다 더 가파르게 느껴졌다. 드디어 열차가 아래로 움직였다. 뭔가 큰 중력이 느껴지는 것 같이 아래로 내려갔다 가파르게 내려가는 열차는 천천히 움직였지만 보기보다 꽤 무서웠다.



그렇게 가파른 산을 내려와 드디어 열차에서 내렸다 보기보다 무서워서 아찔했다. 에코포인트나 링컨스 락에서 본 풍경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블루마운틴을 느낄 수 있었다.


열차에서 내린 후부터는 산책코스가 나왔다. 지금이라도 바로 부서질 것 같은 절벽 옆을 걸어갔다. 수풀이 우거진 곳을 걷고 있으니 날이 덥기는 했으나 시원했다.


그리고 이곳저곳 보이는 고사리 나무들. 고사리 나무를 처음 본 사람들은 고사리 나무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으나, 우리는 뉴질랜드에서 고사리 나무를 너무 많이 보고 와서 그런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고사리가 죽어서 석탄이 만들어진다는 말을 어릴 때 듣고 저렇게 작은 고사리가 얼마나 많이 죽어야 하나 상상을 한 적이 있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는 고사리가 아닌 이렇게 큰 고사리 나무가 한꺼번에 죽은 후 묻혀야 석탄이 된다는 것을 이번 뉴질랜드와 호주 여행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고사리 숲이 아닌 고사리 나무숲을 걸었다.


위에서 내려 보았을 때보다 산이 더 깊고 험한 것 같았다.


또 한 번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을 했다. 절벽 위로 보이는 지층들이 이곳이 얼마나 오래전에 형성된 대지임을 알려주는 것 같았다.


케이블카에는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기에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눈치전쟁이 치열했다.


탐험가들이 이곳을 발견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유럽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풍경들. 이 사람들은 이곳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설레었을까!


케이블카를 타며 블루마운틴의 속을 잠시 엿볼 수 있었다. 블루마운틴을 구경하며 영화 업에 나온 파라다이스 폭포가 있는 곳이 이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드니에서 아침에 블루마운틴으로 이동하고 또 정신없이 구경하다 보니 벌써 점심시간이 되었다. 점심은 불포함 투어라 가이드가 소개해 준 식당으로 갔다. 일요일이라 손님이 많았다. 그래서 빨리 나올 수 있는 메뉴인 햄버거를 주문했다. 날이 덥기에 시원한 콜라 한 잔은 더운 날씨를 조금이나마 식혀주는 것 같았다.



오전에는 블루마운틴을 구경한 후 시드니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페더데일 야생 공원을 들렸다. 여권 모양으로 생긴 입장권에는 입장권과 지도가 있었다.


호주를 여행한다고 어디에서나 캥거루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렇게 동물원에 와야 신대륙 특유의 동물들을 만날 수 있었다.


벌러덩 누워서 자는 친구들도 있고 한가롭게 주말을 즐기는 펠리컨도 보였다.


가장 인기 있는 친구는 아마 코알라가 아닐까! 하루의 대부분을 나무 위에서 잠을 자는 코알라들. 유칼립투스 잎의 알코올 성분에 취해서 저렇게 나무에 매달려 잠만 잔다. 움직이는 코알라를 보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나무 위에서도 저렇게 편하게 자는 것이 신기해 보였다.

누가 잡아가도 모를 정도로 나무를 껴안고 잠을 자고 있었다.


그리고 캥거루같이 생긴 동물 친구들도 있었다. 이것들이 얼마나 약은지 먹이를 들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선 한번 주지 않았다.



우리가 먹이를 주니까 그제야 우리에게 관심을 보였다.




울루루에서 며칠 전에 캥거루 고기를 먹었는데 이곳에서 캥거루를 보니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생각한 호주 여행은 울루루 같은 곳을 차를 타고 달리면 주변에 캥거루 때가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파리만 잔뜩 보고 왔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울루루에서 파리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파리 떼를 그렇게 많이 만나지는 않았다.


동물들이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에도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의 길을 막기도 하고 밥을 달라고 협박을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다.



어느 우리에는 개과의 동물이 보였는데 직감적으로 저 동물이 딩고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딩고의 근육을 보니 울루루 트레킹을 하다가 만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보다 더 강해 보였다. 만약 만났다면 개를 무서워하는 난 기절했을 것 같다.

동물원이 화려하진 않았다. 대신 호주에서 볼 수 있는 야생동물들을 한곳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다. 오전에는 블루마운틴 투어, 오후엔 동물원 구경을 한 후 다시 시드니로 돌아왔다. 주말이라 시드니 부근에서 차가 막히기는 했지만, 시드니에 온다면 꼭 한번 가봐야 하는 두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Earth-traveler > New Zealand & Australia'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7 Jan 1.31 시드니에서의 마지막 날(씨 라이프 아쿠아리움) (0) | 2022.03.28 |
|---|---|
| 2017 Jan 1.30 시드니의 야경에 빠지다 (0) | 2022.03.23 |
| 2017 Jan 1.28 시드니 시내를 거닐다 (0) | 2022.03.15 |
| 2017 Jan 1.27 울루루에서 시드니로 이동 by 젯스타 (0) | 2022.03.14 |
| 2017 Jan 1.26 울루루 카타츄타 국립공원 (0) | 2022.03.10 |